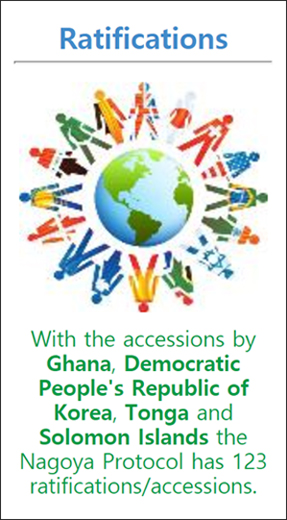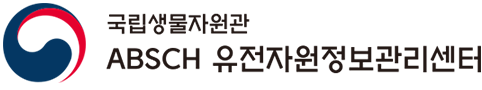뉴스레터
[174호] 북한, 통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19-10-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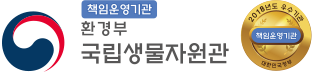 www.abs.go.kr 제174호 2019. 10. 3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 10. 31현재>

10월 이슈
북한, 통가 나고야의정서 비준북한(10.1)과 통가(10.3)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10월 21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2개국, 당사국은 11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은 통가를 포함한 8개국, 아시아 27개국, 아프리카 45개국, 중남미 15개국, 유럽 27개국으로 집계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북한은 2019년 12월 30일, 통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된다. 북한은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국가환경조정위원회를 지정하였다. 국가환경조정 위원회는 보건부, 과학원 등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1993년 2월 설립되었다*. *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제(2004) 참고로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노력에 동참할 것을 표명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아래 현재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자료: KEI(2019) 해외환경정책동향 페루 지식재산권보호청(INDPCOPI), 페루산 포도 관련 독일 특허 모니터링 중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보호청(이하 “INDECOPI”)이 “페루 고유종 포도(Quebranta variety)를 기반으로 독일 특허청에 출원된 4건의 특허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INDECOPI는 페루 외교부와 협조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문제 삼은 보고서를 독일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문제가 된 케브란타 포도종은 오랜 기간 페루 국민주로 불리는 피스코(Pisco) 와인 제조에 사용되어왔다. INDECOPI는 현재 출원된 4건의 독일 특허가 유럽 특허법에서 명시된 특허 출원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여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INDECOPI는 페루에서 해당 포도종을 ‘전통방식’으로 와인을 제조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해왔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독일 특허청에 출원된 4건의 특허는 개인이 낸 특허로 다음과 같다.
한편, 페루의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 는 페루 원산 생물자원을 이용한 45건의 외국 특허 출원(독일,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성공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위원회는 “페루 토착지역공동체의 관련 전통지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외국 특허들이 특허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Comisión Nacional contra la Biopiratería):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페루원산 35가지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세계 주요 특허청의 특허 중 생물해적행위에 해당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INDECOPI가 위원장을 맡고 있음. 시사점: 생물자원 특허와 나고야의정서 이행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특허의 효력은 특허를 출원한 해당국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페루 정부가 외국 특허청에 출원된 페루산 생물자원 관련 특허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외국 특허를 취소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는 독일,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주요 생물해적행위 모니터링 국가로 판단하여 우리나라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주시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유역 등 풍부한 지리적 조건으로 다양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기도 한 페루는 자국산 생물자원을 나고야의정서 상 PIC, MAT 의무준수 없이 특허 출원 하는 행위를 ‘생물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자는 외국 생물자원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생물지원의 원산국이 우선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국내 이행법이 존재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페루의 경우 자국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ABS 의무와 특허를 연계하고 있으므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엔개발계획(UNDP), “DSI와 ABS 웹세미나” 개최
9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디지털서열정보(D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 웹세미나」가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물리적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보다 생물자원 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과학 기술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생물정보를 ABS 체제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두고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DSI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견해가 다양하여 현재 “DSI”라는 용어 자체를 국제 협상 용어로 인정할지 여부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UNDP 주최 웹세미나에서는 DSI와 ABS에 대한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견해를 듣고 디지털 포맷을 통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다. <웹 세미나 개요>
CBD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DSI 논의 동향합성생물학과 DSI 문제는 2012년 제18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18)와 제11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논의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2016년 제13차 당사국총회 및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DSI 이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별 의견을 취합하고 CBD 사무국에서 사실기반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DSI 전문가회의(ATHEG)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DSI 전문가회의는 논의결과를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STA22)에 상정하였으며 SBSSTA22에서 논의 후 권고문을 2018년 제14차 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제출했다. 제14차 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DSI에 대한 국가별 정책과 개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사무국에 DSI에 대한 4건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DSI 전문가회의의 권한을 연장하여 이를 논의한 후 POST 2020 작업반회의에 결과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헨드릭 세저스 벨기에 국가책임기관은 “DSI 논의결과를 SBSTTA가 아닌 POST 2020 작업반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과학적 진전사항보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DSI 문제는 CBD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량농업기구 산하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국제조약(FAO ITPGRFA), 세계보건기구 산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WHO PIP Framework), 유엔해양법협약 산하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정부간회의(UNCLOS BBNJ)등이 있다. 나고야의정서 관점에서 본 DSI인도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기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도 법환경개발거버넌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발라크리쉬나 피수바티 박사는 “DSI 용어에 대한 국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과학 분야에서는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보다는 GSD(Genome Sequence Data)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퀀싱 및 합성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DSI 이용 빈도 및 이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약 1700개 정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개방형으로 모두에게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은 EMBL 등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가 가장 많고(55개), 그 뒤를 미국 GenBank 등 45개 데이터베이스, 3위는 캐나다(6)와 일본(6), 우리나라는 2개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SI와 특허 쟁점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제3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면 20년간 시장독점권을 얻게 된다. DSI와 지재권 쟁점을 발표한 조지 메다글리아 교수는 특허출원서에 명시된 실제 DSI 사례를 발표하며 DSI와 특허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특허출원제도가 나고야의정서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다글리아 교수는 “유전자원의 원산지국 공개 또는 해당 유전자원이 합법적으로 획득된 것인지를 특허 출원시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면, 나고야의정서 이행 모니터링 효과 및 이익공유 의무준수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특허출처공개 요건을 입법화했으나 대부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predate) 마련되었으며, 출처공개 대상이 자국 유전자원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메다글리아 교수는 동일한 특허를 자국뿐 아니라 유럽 특허청(EPO)이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를 통해 출원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출처공개의무화 요건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점: DSI의 의미앞서 살펴보았듯이 DSI는 2012년 처음으로 국제회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신규 이슈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DSI의 역할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면 20년간 독점배타권을 얻게 된다. 새로운 발명에 DSI가 앞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DSI는 특허출원에서도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특허 강국이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 이용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DSI와 특허제도에 대한 국제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UNDP의 웹세미나와 같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의 경우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DSI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CBD뿐 아니라 FA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논의되는 만큼 DSI는 앞으로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
| 이미지 파일 | ||||||||||||||||||||||||||||||||||||||||||||||||||||||
|---|---|---|---|---|---|---|---|---|---|---|---|---|---|---|---|---|---|---|---|---|---|---|---|---|---|---|---|---|---|---|---|---|---|---|---|---|---|---|---|---|---|---|---|---|---|---|---|---|---|---|---|---|---|---|